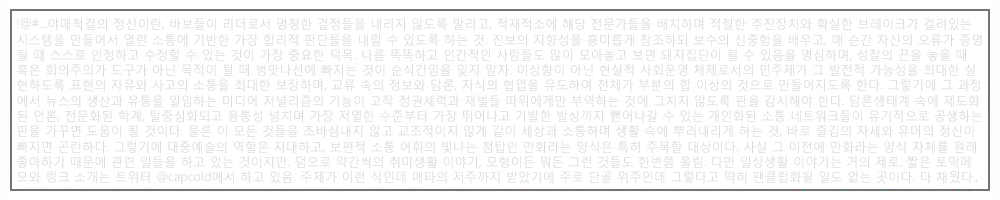!@#… 선정주의의 반복되는 기본 요소에 관하여. 게재본은 여기로: 현명하게 뉴스보기 11: 클릭낚시질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현명하게 뉴스보기 11: 낚시질에 초연해지기
어떤 플랫폼이 있고 그 플랫폼이 충분히 주류적 인기와 관심을 모으면, 거의 필연적일 정도로 어뷰징(파괴적 오남용)이 생겨나곤 한다. 최근 수년동안 급부상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유통도 마찬가지다. 이미 미국은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뉴스를 접하는 핵심 유통망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아직 포털의 장악력이 강하게 남아있는 한국 또한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소셜망 뉴스유통을 공략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 언론공간에서 기사의 노출은 계량화되어 곧바로 광고 수익으로 이어지지만, 반면 기사의 품질 같은 규범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하되 정작 측정하기는 어려운 속성들은 수익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상당히 지난하다는 산업적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소셜망에서 노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뉴스 소개문으로 교묘한 낚시를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고, 속칭 ‘클릭낚시질'(click-baiting)이라는 용어까지 붙었다.
클릭낚시라고 부르면 어쩐지 첨단의 뉴미디어 트렌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평범한 언론의 선정주의 전통을 소셜미디어 환경에 맞춘 유행일 뿐이다. 전통적인 언론 헤드라인의 선정주의적 낚시의 기본틀은 원래 크게 세 가지의 요소를 담아내곤 한다.
- 헤드라인 서술에 적극적으로 감질맛 부여: 원래 정상적 언론규범에서라면, 헤드라인은 정확하고 명료한 요약을 지향한다.
- 읽어야할 이유 과대포장: 원래는 읽어야할 이유는 정보 자체에서 드러나야 한다.
- 통속적 공감대에 호소: 원래는 해당 뉴스의 사회적 함의에 호소해야 한다.
이런 요소는 소셜망의 클릭낚시질의 부흥 이전에, 종이신문 가판대의 황색신문들이 이미 추구한 것이다. 그리고 이 방식은 진지한 척 하던 뭇 언론사들이 품위 따위 집어던지고 소위 ‘디지털뉴스팀’을 굴리며 포털사이트 뉴스공간을 마음껏 유린하느라 온라인에 그대로 이식한 바 있다. 얼마나 바닥까지 갈 수 있는지는 이미 슬로우뉴스에서도 여러번 더 자세히 다룬 바 있다.
- 내용요약형 제목인데 수사와 말줄임표로 상황 극단화 및 중간에 설명 끊음: “한류스타 A, 파문의 진실은…”
- 특종, 단독이라고 과시: “[단독] 국회 회의록 입수”
- 통속적 가십 코드를 중용: 아침드라마적 서사, 허리하학적 암시 / “女아나운서, 클럽女 춤보더니 흥분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유행하게 된 클릭낚시질은 이런 센셔이셔널리즘의 기본틀을 좀 더 개인화된 느낌으로 조금씩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내용요약형이 아닌 궁금증형 제목: “세계인이 놀란 아프리카 소녀의 모습이란?”
- 너도 반드시 알아야하는 것이라고 압박: “당신이 30대에 반드시 알아야할 것 17가지”
- 통속적 감동 코드를 중용: “평생 처음으로 축사에서 나와 잔디를 밟아본 소의 반응을 보니…”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경우라면 헤드라인이 약속하는 것에 비해 실제 내용은 크게 부족할 개연성이 높다. 우선, 읽을 욕구를 유발시키려면 온갖 과장을 동원해야만 하는 수준의 내용물이라는 반증이니까 말이다. 또한 누군가가 꼭 알아야하는 정보라고 판별하는 것은 원래 어렵고 조심스러운 작업이기에, 그것을 명쾌한 듯 제시해준다면 아마도 틀렸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속적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실제 사건을 단순한 방향으로 마음껏 왜곡시키기 쉬운 방식도 드물다.
이런 클릭낚시질의 범람이 오죽했으면, 그런 현상을 조롱하기 위해 “내가 대신 미리 클릭해줬는데 이런 실없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savedyouaclick 트위터 계정이 히트쳤겠는가. 또한 ‘소셜 최적화’와 낚시의 경계는 희미하고 기준도 계속 바뀌곤 해서, 미국에서 한때 클릭낚시질의 대명사격이었던 허핑턴포스트가 버즈피드에게 왕좌를 넘긴 것이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그 버즈피드 또한 최근에는 온갖 한층 더 한 악성 낚시꾼들과 동류로 묶이지 않고자 자신들이 하는 것은 클릭 낚시질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펼치고 있다.
클릭낚시질이 언론에 주는 폐해, 예를 들자면 그것이 일시적 클릭 증가로 수익을 올리지만 신뢰성이라는 매체의 가장 기초적인 밑천을 갉아먹는 자멸행위라는 문제는 다른 기회에 더 깊게 논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독자로서 할 수 있는 것, 즉 저런 낚시질에 어떻게 덜 당할 수 있을까를 되짚어보도록 하겠다.
아니 사실 길게 되짚을 필요도 없다. 그냥 저런 것은 읽지 말라고 하면 간단하기는 하겠지만, 뉴스사이트의 헐벗은 옷차림과 “허걱 충격” 문구에서 이목을 떼는 것이 어려웠듯 소셜망의 클릭낚시질 역시 그렇다. 그보다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충분하다. 저런 형식의 소개문 또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읽어달라고 손을 내밀면, “그냥 내 공감대를 건드리는 척 하면서 소중한 인생의 30초를 낭비하는 콘텐츠겠구나” 하고 미리 마음을 비우면 된다. 물론 의외로 좋은 콘텐츠일수도 있기는 하다. 진지한 언론사라도 어떻게든 온라인문화에 적응해보겠다고 무리해서 “개드립”을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눈에 봐도 포장지가 쌈마이스러울 때는, 포장지 속에 담긴 것에 대한 기대수준을 대단히, 매우, 굉장히 낮춰놓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
그리고 웬만큼 예상을 크게 벗어나 놀라 자빠지게 뛰어나지 않는다면 공유는 당연히 하지 말고 ‘좋아요’ 같은 것을 눌러주지 않는 것도 나름의 작은 복수다. 매체 단위로 차단하는 기능이 있는 웹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면(예: 현재의 페이스북), 그런 기능을 굳이 썩혀둘 필요도 없다. 잊지 말자. 그들이 원하는대로 보상을 주면, 그들은 앞으로도 딱 그 정도의 것만 들이밀 것이다.
_Copyleft 2014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_
[이 공간은 매우 마이너한 관계로, 여러분이 추천을 뿌리지 않으시면 딱 여러분만 읽고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