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너를 서울하겠다
김낙호(미디어연구가)
“방법하겠다”라는 말이 2000년대 초반 온라인 세상을 풍미한 적이 있다. 게시판 커뮤니티에서 어떤 난감한 행동을 한 이를, 다른 사용자들이 패러디든 덧글 폭탄이든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으로 응징한다는 뜻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유행했다고 해도 여전히 온라인문화에 심취한 이들에게만 통하는 은어일 수 밖에 없었는데, 명사를 동사로 고스란히 쓰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의미 공유가 사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거의 비슷한 느낌의 조어를 접하게 되었는데, “서울하겠다”라는 말이다. 최근 확정된 서울시 새 브랜드 공모 당선작인 “I SEOUL U”다.
브랜드에 담긴 컨셉트, 선정 과정의 정당성 확보는 칭찬할 구석이 많다. 참여와 개방을 중심에 놓는 도시 브랜드의 흐름도 잘 지목해냈고, 다양한 응용의 여지를 처음부터 열어둔 것도 적절하다. 선정 절차 역시 기관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설명과 설문을 모아서 충분히 많은 표를 얻어낸 것으로 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종 선정작이 발표되자마자 온라인 등지에서 비판이 넘쳐났는데, “나, 서울, 너”라는 식으로 서울이 우리를 연결해준다는 느낌을 주려는 의도와 달리 그냥 하나의 문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문형이 너무 명쾌하기도 하고, 영어에서 너와 내가 함께 한다는 어감은 주로 me를 쓰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가 너를 서울하겠다”로 읽히는 순간, 서울 생활에서 겪는 온갖 힘든 모습들이 그 동사의 뜻을 손쉽게 채워낸다. 즉 외부에서는 의아해하고 내부에서는 부정적 소재가 되어버린다.
절차의 정당성, 사려 깊은 컨셉트는 미덕이지만, 그것이 곧 결과물의 품질은 아니다. 담당측의 발표에 따르면, 컨셉트를 설명하고 나니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해당 당선작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한다. 일견, 충분한 정보와 숙의를 거친 소통의 승리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데, 애초에 브랜드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해가 아닌 직관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정합성에 대해 생각하느라, 완성된 문장 형식의 함의라는 단순한 치명타를 놓치는 격이다. 필자도 스스로의 유머에 대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역설과 말장난과 풍자를 설계해 넣었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이 웃기지 않았다면 그냥 망한 유머다.
물론 결과물이 난감하다고 과정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결과물을 인정하고, 결과를 낳은 허점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탐색해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할 따름이다. 실제 적용을 염두에 두며 응답군을 세밀하게 구분하고, 참여 전문가의 분야 폭도 넓히고, 의견 그룹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비판들도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적 소통 절차를 선의 너머 더 정교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말이다. 이런 것은, 그저 서울시 브랜딩 사례 하나에 한정되는 교훈이 아닐 것이다.
======================
(한국일보 칼럼 [매체는 대체]. 매체를 매개로 펼치는 세상사칼럼.)
_Copyleft 2015 by capcold. 이동자유/수정자유/영리불허_
[이 공간은 매우 마이너한 관계로, 여러분이 추천을 뿌리지 않으시면 딱 여러분만 읽고 끝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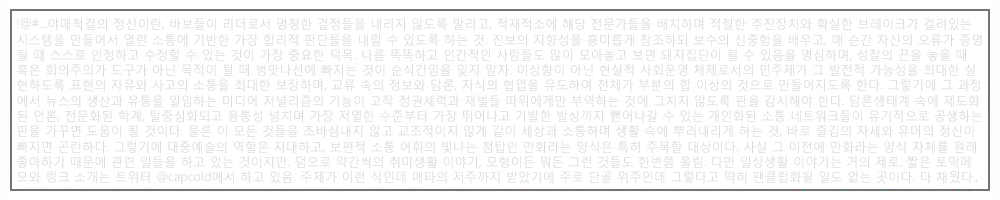
Pingback by 베스트 오브 2015: 미디어/시사 | capcold님의 블로그님
[…] 아이 서울 유: 다들 기억하실테니, 멘트는 관련글로 서울하겠다… 아 아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