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호에 실렸던 ‘푸른 알약’ 리뷰. 에이즈라는 꽤 자극적인 소재를 가지고도 참 솔직한 생활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라 인상적인데, 한편으로는 의료복지체계가 잘 발달한 서유럽권의 나라이기에 그나마 이 정도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러움이 먼저…;;;
사랑의 조건 – 『푸른 알약』
김낙호(만화연구가)
질병이란 참 성가신 것이다. 특히 만성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아파서 아무런 대인활동도 하지 못하고 단지 회복에만 전념하기에는 아직 인생을 살만한 정도의 힘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병이 가벼운 것은 아니니 자꾸 신경 쓰이고 조심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주변인들의 시선까지 겹치면 한층 복잡해진다.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것만으로도 불안해 죽겠는데, 정작 주변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고 호들갑을 떨어서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다.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에 인간 아무개가 아닌, ***환자 아무개로 사회적 위치가 지워진다. 게다가 이 과정에는 병의 증세가 얼마나 심각한가보다는, 병 자체가 어떤 병인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곤 한다. 즉 병이 바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이 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현존하는 만성적 질병 가운데 가장 사회적 정체성으로서의 ‘힘’이 강한 것은 바로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다.
만화 『푸른 알약』(프레데릭 피터스 / 세미콜론)은 바로 ‘에이즈 환자’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강요당한 여성과 평범한 사랑을 나누는 한 만화가의 자전적인 연애담이다. 작품은 무거운 상징과 과잉된 감정의 드라마를 피하고, 일상적인 생활일기를 적어나가듯 소소한 순간들을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살짝 망설이며 잡아낸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도, 솔직함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 세밀한 연출과 정제된 대사의 함축을 피하고, 세 달 가량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일필휘지로 그려내어 가장 자신들의 생활을 진솔하게 그려낸다. 자연스럽게, 사연은 복잡하고 줄거리는 간단하다. 젊은 만화작가 프레드는 19살 당시 한 파티에서 우연히 만나서 반했던 여자 카티를 다시 만나게 되고, 이혼 후 아들과 함께 사는 그녀와 정식으로 교제하게 된다. 그런데 카티는 자신과 아들이 HIV 양성반응, 즉 에이즈 보균자임을 밝힌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한 우려도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치료에 대한 희망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둘, 아니 아들까지 합쳐서 셋은 사랑을 하며 살아간다. 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에이즈라는 꽤 사회적으로 무거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서로의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솔직한 대화와 때로는 공상의 형식을 빈 성찰이 극의 전반을 이끌어 나간다.
작가주의 성향 독립 출판사에서 작업한 스위스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푸른 알약』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화려한 필치가 많은 편인 유럽 작가주의 만화들의 일반적 성향과는 다소 다르다. 거칠지만 유연한 선 중심으로 그려진 흑백의 그림은 상황을 희화화하지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사진에 가까운 현실적 묘사로 부담을 주지도 않겠다는 작가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다. 나아가 칸 연출 역시 현란한 변화 없이 안정적인 구도를 통해서 칸 속 캐릭터들의 감성에 이입시킨다. 그리고 일상적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간다는 전체적 컨셉을 유지하면서도, 에이즈라는 사랑의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내적, 외적 고민의 흔적은 확실한 클라이막스를 갖춘 뚜렷한 기승전결 구조 속에서 진행된다. 즉 독자들에게 넋두리를 들려주는 공개 일기장이 아니라, 자서전적이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하나의 완성된 재미있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틀 속에서, 이 작품은 에이즈 보균자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묘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에이즈라는 질병 자체가 아니라 그저 사람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발병 억제를 위하여 아이에게 약을 갈아서 먹여나가는 과정에 대한 세부적 묘사, 막연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에이즈 보균자와의 성행위라는 상황 속에서 대처해나가는 연인들의 시행착오(?)의 현실감은 이들에게 에이즈가 결코 부차적인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에이즈라는 질병 자체로 따로 존재한다기보다, 그들의 사랑에 주어진 하나의 조건이다. 사랑을 하려면 에이즈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상당히 강력한 악재이기는 하지만, 이들에게는 열렬한 마음의 사랑과 에이즈라는 현실 조건의 괴리 사이에서 고뇌하는 뻔한 고통의 풍경이 보이지 않는다. 열렬한 사랑은 이미 하는 것이고, 에이즈는 불편하고 두렵지만 같이 대처해나가야 할 조건이다.
작품에서 그려지는 에이즈에 대한 대처의 방향은 두 가지다. 하나는 에이즈라는 상징에 대한 ‘인식’을 통제하는 것, 다른 하나는 질환 자체에 대한 통제다. 마음과 몸을 다루는 이 두 가지는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둘 다 성공할 때 비로소 사랑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된다. 우선 에이즈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은 어떨까. 작품에서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사회의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란 이렇다: “반응은 두 가지인 것 같아. 하나는 우호적인 반응으로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쪽이고 또 하나는 가장 흔한 반응이지. 이해하는 척하면서 경계하는 쪽.” 그런데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남자는 경계의 단계는 일찌감치 뛰어넘고, 이해나 격려도 넘어 아예 같이 안고 사는 쪽을 선택하고자 한다. 그에 비해 질환에 대한 통제라면, 약물치료를 계속 받는 것과 전염을 막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당연히 다양한 두려움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작은 생채기 상처에도 민감해지고, 콘돔이 파손되면 원치 않는 임신 정도가 아니라 에이즈 전염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이다. 아무리 의사의 설명으로는 그것이 “당장 문을 열고 나가면 하얀 코뿔소를 만날 확률”에 불과하다고 해도, 항상 하얀 코뿔소는 바로 뒤에 서있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 남자, 결국 자기의 뒤에 항상 코뿔소가 서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불안마저 같이 안고 살아가는 쪽이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받아들이는 남자, 그리고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도 충분히 강한 여자.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두 사람을 믿고 자라나는 아이. 어쩌면 너무나 모범적인 사랑이라서 질투가 날 정도다.
솔직하고 재미있는 작품이 소개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특히 특수한 상황과 보편적 정서가 서로 교차하는 작품이라면 더욱 그렇다. 악조건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극복하며 사랑을 꾸려나간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있는 실화라면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작품 속 내용이 지난 후, 현재 실제 세계의 작가 부부는 HIV 양성반응이 없는 건강한 딸까지 낳아서 잘 살고 있다고 한다. 어쩌다가 한번쯤은 세상에 정의도 있구나, 하는 즐거움은 이 작품이 주는 또 다른 보너스다.
======================================
(격주간 <기획회의>. 한국출판마케팅 연구소 발간. 여기에 쓰는 글에서는 ‘책’이라는 개념으로 최대한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야 어찌되었든. 즉, 업계인 뽐뿌질 용.)
– Copyleft 2007 by capcold. 이동자유/동의없는개작불허/영리불허 —
 |
푸른알약 프레데릭 페테르스 지음, 유영 옮김/세미콜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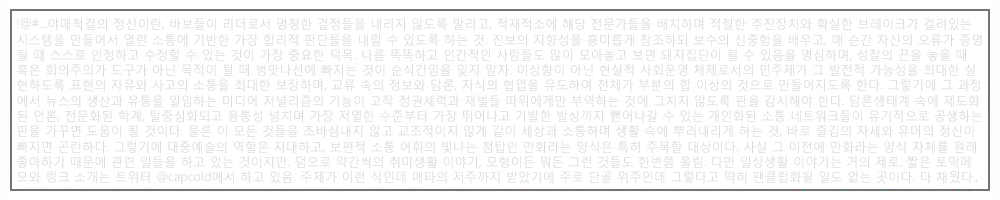
Pingback by 일다의 블로그 소통
붉은 반점도, 넘치는 눈물도 없는…
HIV보균자 연인과의 삶 그린 만화 2001년 스위스의 독립만화 출판사 아트라빌에서 출간된 프레데릭 페테르스의 자전적 만화 은 HIV양성보균자 연인과의 사랑을 담담하게 풀어가면서 ‘에이즈…
Pingback by dcdc의 잡담창고
[푸른 알약] 아찔한 푸근함….
남자 : 부조리…부조리극…음…부조종사…부조초…아! 찾았다! 부조화! 부조화: 명사. 하다형 형용사. ‘적절하거나 조화롭지 못함. 서로 어울리지 아니하며. 예를 들어, 불협화음.’ 또 지질학 용어로는 ‘이전 지층 위에 불연속적으로 퇴적된 땅, 즉 부정합’을 말한다…빌어먹을, 믿을 수 없어! 이게 소위 의사들이 쓰는 정확한 용어라는 거야?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라니?! (중략) 당신 생각엔 말이야..우리가 적절하지도…
Pingback by 파인로
@Maengmul http://capcold.net/blog/891 @capcold 님의 서평도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