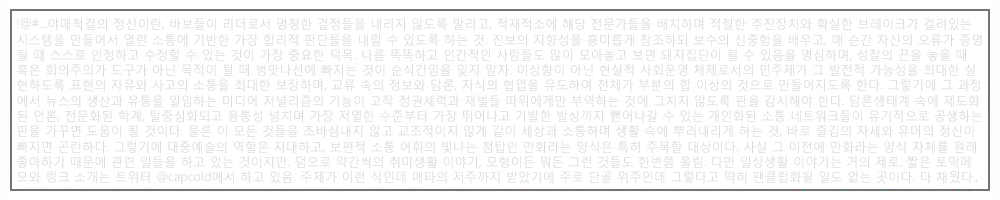!@#… 결국 내 입장은, 김영란법의 방향성을 인정하되 서투른 디테일 부분은 개선하는 것. 그 디테일은 무슨 액수 상한 늘리기 그런게 아니라, 적용 상황과 양형을 더 현실적으로 세분화하는 것…이지만, 뭐 그런 이야기는 차차 다른 기회에. 게재본은 늘 그렇듯 더 흥미로운 제목으로: 3만 원으로 밥 못 먹는다는 기자들에게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언론의 세 가지 논지
김낙호(미디어연구가)
공인의 뇌물 거래를 막자고 주장할 때 반대할 사람은 드물다. 공명정대니 투명성이니 온갖 멋진 개념어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기도 어렵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해 한 꺼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격다짐 치열한 이해관계가 펼쳐진다. 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잡을 것이며, 뇌물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막을 것인가. 그런 것을 정하는 와중에서 원래 내게 유리했던 관행을 어떻게 열심히 지켜낼 것인가. 최근 합헌 판결을 받아 실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 창안자를 기리기 위해 붙은 명칭인 김영란법, 혹은 김영란 전 대법관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더치페이법’을 대하는 언론업계의 모습이다.
김영란법이 처음 제안된 머나먼 옛날, 그러니까 2012년은 소위 스폰서 검사들이 기존 법망의 구멍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빠져나가자 여론이 들끓었던 시기였다. 그래서 명시적인 거래라는 좁은 범위 너머, 포괄적으로 부정청탁을 강력하게 금지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후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며 전관예우에 대한 규제가 흐지부지되고 포괄적 부정청탁 개념도 사라졌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대상범위는 늘어나서, 급기야 언론인까지 확장된 것이다. 언론은 공무원 도덕성을 훈계하던 지위에서 졸지에 당사자가 되어버렸고, 강한 규제를 부르짖던 목소리 중 일부는 슬그머니 과도한 규제를 성토하는 목소리로 바뀌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헌법소원이라는 최종관문을 넘어서며 시행을 앞둔 지금, 김영란법을 반대 또는 경계하는 언론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그 중 가장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민간 영역 규제의 문제다. 한국기자협회가 당초에 헌법소원을 냈던 핵심 논지는, 언론인은 실제 공직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의 행위자이며 나아가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공무원을 상정한 규제 방식에 강제로 편입시키면 곤란하지 않은가. 그런데, 생각만큼 곤란하지 않다. 합헌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의 취지는 공무원이라는 직책이 아니라 공인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부패를 막자는 것이고, 언론이 자기 존재 필요성을 증명하고자 동원하는 가장 흔한 논리가 바로 공적 역할이기 때문이다. 직군에 따른 양형 같은 세부 내역은 계속 개선해야겠지만, 공인이라는 적용 범위에서 언론이 벗어날 명분은 희박하다.
둘째 입장은 김영란법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의 재갈물리기로 악용될 것이라는 논지다(링크). 취재원과 신뢰 관계를 만들기 위해 접대가 오가는 관행은 뿌리 깊고, 경직된 법률로 규정해놓은 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쉽다. 모두가 빨간 신호등을 넘어 횡단하는 상황에서, 손쉽게 미운 놈을 골라서 잡을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이 논지 역시, 취재관행을 바꿔나가다 보면 별반 걱정거리가 아니게 된다. 애초에 언론규범에서 받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들어오는 금품과 접대를, 이제는 그만 곤란해 하고 그냥 법 핑계를 대면서 안 받으면 깔끔하겠다. 또한 특정 언론사나 논조에 대한 억압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단속 당국이 공평하게 일하는지 감시하면 된다. 공무에 대한 감시라니, 어째 원래부터 언론의 역할 같다.
셋째 입장은, 계속 좋은 것을 받아먹고 싶다는 굳은 의지다. 이 입장은 핵심 소망을 워낙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모두를 민망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식사를 얻어먹는 한도인 3만원이라는 액수에 대한 집착이 여기 포함되는데, 그런 액수의 밥을 얻어먹는 것으로는 취재가 안 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일갈이 좋은 사례다(링크). 뜬금없이 한우와 굴비 산업이 망한다고 걱정해주는 조선일보의 논법 역시 (링크), 그 쪽이 청탁성 접대가 아니면 활로를 찾지 못하는 허약한 산업 분야라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한우와 굴비를 계속 받아먹고 싶다는 의미일 것이다. 혹은 아예 언론에 대한 그런 규제는 “저급한 입법”이라며 거친 락앤롤 자의식을 과시하는 어느 “경제신문”도 있다 (링크). 앞선 두 가지 논지, 즉 김영란법의 민간 규제 문제나 재갈물리기 위험에 대한 걱정은 여하튼 언론은 접대 문제를 업계 자율로 자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비싼 밥 좀 얻어먹고 싶다는 논지에 입각한 언론기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혼란의 과도기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정말로 민간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취재도 경직되고, 정부의 누군가는 비판 언론 억압을 시도하고, 기어이 접대를 받아내기 위한 기상천외한 우회 방법도 발명되어 법률의 유효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하지만 뿌리 깊은 관행을 바꿔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럴수록 외부의 충격이 유효할 때가 있다. 삼성이 아이폰 충격을 받아들여 ‘옴레기’를 갤럭시로 바꿔내었듯이, 언론계가 김영란법 충격을 잘 활용해내기를 바랄 따름이다.
_Copyleft 2016 by capcold. 이동자유/수정자유/영리불허_
[이 공간은 매우 마이너한 관계로, 여러분이 추천을 뿌리지 않으시면 딱 여러분만 읽고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