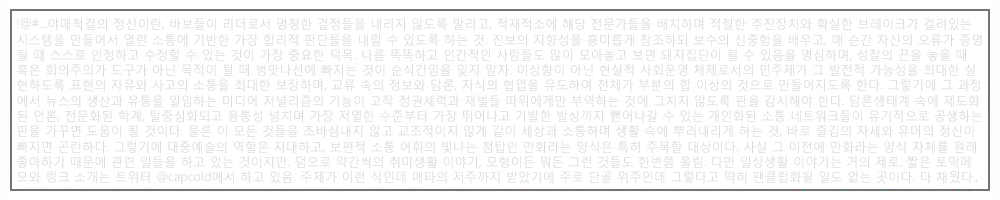흔히 ‘타자’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들이 쉽게 지나치는 일상적인 습관들이 사실은 얼마나 전혀 일상적이지도, 당연하지도 않은지를 탐지해내는 능력이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완전한 타인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거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들’의 생활을 깊숙하게 같이 겪고 느낄 수 있어야 섬세한 발견이 가능하니까. 따라서 타인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외부인은 아닌 미묘한 균형점 위에 있는 자들이야 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타자의 눈이다.
<새댁 요코짱의 한국살이>의 주인공인 ‘요코짱’은 앞서 말한 그 중간지점에 서있는 주인공이다. 이 작품은 중국유학 도중 만난 한국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살게된 작가가 이곳에서 겪은 여러 가지 신기한 일상을 짧은 호흡의 에피소드로 구성한 만화다. 대충 그린 주인공이라든지 잡담식 전개 등 부담없는 연출에, 일본어에 한글 자막 입히기 등의 기법 덕분에 평범한 일본사람이 일상적 수다를 듣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감상할 수 있다. 버스를 타며 다른 아줌마들과 경쟁하기, 한국식 가족관계에서 자리 자리잡기… 사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아줌마들의 에너지에 주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더욱이 그것을 은근히 부러움 섞인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것도 그리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런 아줌마 사회에서 아줌마가 되어가는 모습을 웃으면서 자랑하는 모습은 남모를 재미를 준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네 아줌마들이 억척스럽지만 따뜻하고 인정많다는 것은 어차피 우리들도 다 아는 이야기다. 그런데 왜 요코짱의 이야기로 들으면 더 무릎을 치게 되는 것일까? 간단하다. 타자의 눈이 주는 진정한 재미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남’이 확인해주었을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타자의 입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있던 바가 맞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심정 말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요코짱이 묘사하는 한국 아줌마들의 오늘날 모습들에 즐거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요코짱이 ‘타자’라는 사실에 감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요코짱은 한국인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면 안되고, 매번 오해에 부딪혀주어야만 한다. 요코짱이 ‘우리’가 되면 매력을 잃어버릴테니까.
세계화되었다고 자평하면서도, 실제로는 타자들이 타자로 남아있어주기를 바라는 은근한 폐쇄성이 아직 공존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요코짱의 만화일기가 히트를 치는 2000년대 한국, 우리들의 풍속도다.
(글 김낙호/만화연구가·웹진 ‘두고보자’ 편집위원)
[경향신문 / 2004. 6. 18]
(* 주: 원출처는 경향신문 토요 만화 전문 섹션 ‘펀’의 칼럼인 <만화풍속사>입니다. 격주로 박인하 교수와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는 일종의 태그팀 같은 것이니 만큼, 같이 놓고 보면 더욱 재밌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