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이별, 남겨진 이들 – 『아버지 돌아오다』
김낙호(만화연구가)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의식인 장례란 세계 어느 문화에서나 많은 의미가 부여되곤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은 제의적인 의식이 거의 없이 오로지 잘 태어나느냐 마느냐의 의학적 관심사로만 가득한 반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은 오히려 정작 본인은 이미 죽어서 아무 것도 느낄 수 없을 터인데도 온갖 상징적 행위로 가득한 행사들이 이어진다. 그리고 그 행사의 주인은 바로 고인이 떠난 후 남겨진 이들이다. 그 중 가장 가까웠던 이들이 상주가 되고, 각종 지인들이 와서 명복을 빌어주고 간다. 그 와중에서 고인이 인연을 맺었던 여러 사람들이 서로를 확인하며 좁은 세상을 실감하곤 한다. 그렇듯 자고로 장례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행사인 셈이다. 고인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 저 세상에서 못 다한 무언가를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실제로 장례식에서 마음을 추스리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아버지, 돌아오다』(최덕규 / 길찾기)는 오랜 투병생활 끝에 운명을 달리한 한 아버지의 장례식과,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야기는 아버지의 죽음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의 영혼은 구천을 떠돌며 자신의 장례절차를 지켜보게 된다. 무언가 한이 남아서 귀신이 된 것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영혼의 힘으로 남겨진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갈 수 있는가 하면 그것도 또한 아니다. 심지어 유일하게 고인의 혼백을 볼 수 있는 사위 역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없다. 다만 고인이 세상을 지켜보듯, 그 또한 고인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극적 긴장감이나 모험을 위한 혼백의 떠돌아다님이 아닌, 장례식은 물론 고인과 그 주변 사람들의 모든 변화 과정을 자유롭게 관찰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혼백인 셈이다. 그렇듯 이야기는 그저 장례식 절차, 그리고 고인이 죽음으로 향해갔던 지난날의 투병생활 이야기 두 가지로 진행될 뿐이다. 기억은 고집스럽게 그가 죽음까지 갔던 그 전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고, 그 과정 속에서 가족이 감내한 이야기들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위암 진단, 간병 생활, 그리고 결국 첫 페이지의 장례식으로 돌아오는 큰 흐름은 죽음의 전 과정을 큰 원으로 감싸 안으며, 화장이 끝나고 결국 남겨진 이들의 생은 계속된다.
혼백이 구천을 떠도는 고인은, 사실 그다지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는 아니었다. 그저 평범하게, 마누라 속도 썩이고 딸 부부에게 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이며, 주변에도 좋은 일도 욕먹을 일도 하면서 살아온 듯한 인생이다. 그리고 투병생활이 되자, 가부장으로서의 자존심과 병세의 고통 사이에서 결국 수발하는 가족들에게 성질부리며 힘들게 하는 존재로 9개월간 살게 된다. 그것은 난데없이 새로운 일이 아니며, 원래 이 가족이 살아왔던 구도가 좀 더 병이라는 것을 계기로 분명해진 것 뿐이다. 이렇듯 지극히 일상적으로 가족 사이에는 골이 있었고, 그 골은 가족을 절단낼 정도의 깊이는 아니지만 모두에게 화해를 할 계기가 없이 만성적인 곪음으로 남아있던 것이다.
그 모든 과정을, 이제는 내부의 인물이 아니라 외부의 관찰자로 바라보게 된 고인의 혼백이 되새김질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작가의 필치 속에서 디테일 넘치게 펼쳐진다. 밥상을 차리는 장면, 병원에 문병 왔을 때 수발하는 부인의 표정, 방사능 항암치료로 머리를 밀고도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자존심을 세우는 고인의 허세 등 모든 것이 섬세하게 그 망가지는 – 아니 망가짐이 확연히 드러나는 – 과정을 보여준다. 부분적인 2도 컬러의 현재와 흑백으로 묘사된 과거의 모습은 두 시간이 어떻게 서로 대위를 이루며 진행되고 있는지 천천히 그러나 끈질기게 보여준다. 아버지의 죽음과 아기의 새로운 탄생을 병렬하는 비유 같은 지나치게 익숙한 상징구도의 활용은 담담한 느낌을 다소 해치는 느낌도 있지만, 워낙 서술 자체에 대한 진중함이 압도적이기에 큰 약점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작품의 미덕은, 인간극장 다큐멘터리를 표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담담하게 바라보지만 그것은 무언가를 폭로해서 도발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 사는 모습의 자연스러운 오해와 갈등, 때로는 약간의 해소, 하지만 또한 남는 앙금과 응어리를 있는 그대로 펼쳐보여 주어 삶을 되짚어보는 것 뿐이다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이야기 얼개가 고인의 시점이 아니라, 고인의 혼이 발견하게 되는 그 주변 남겨진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개된다. 죽기 전의 과정 역시 고인의 투병생활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의 간병생활과 그것이 생활 속에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말이다. 이러한 접근은 독자들로 하여금 묘한 이입을 느끼게 하는데, 실제로 독자 본인이 이미 고인의 입장에 처해 있을 가능성보다는 고인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입장이 되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그렇듯, 죽음이란 결국 주변인들, 남겨진 자들의 이야기다. 고인에게는 (종교적인 내세 개념은 논외로 하자면) 죽음이 끝이지만, 주변인들에게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작은 이전의 생활방식의 정리와 단절을 필요로 하고, 그렇기에 화려한 되새김과 마지막 정리를 위한 큰 행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 작품을 읽다보면 장례라는 것의 의미, 남겨진 자들을 위한 행사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오히려 다시한번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되짚어보며, 그 속에서 주변인들이 어떤 경험을 겪어야 했는지를 알게 된 아버지는 이제 살아있는 가족에게 화해를 청한다. 자신의 과오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잘 살기를 바라는 떠나가는 자의 미덕이다. 그리고 화장과 함께 가루가 되어 혼백은 성불한다. 그럼, 화해는 이루어졌을까? 물론 아니다. 살아 남아있는 가족들이 자신들의 마음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묻고 정리할 뿐이다.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화해와는 다르다. 한 쪽은 가고 없으며, 다른 쪽은 이제 그를 용서할 수도 계속 한을 품을 수도 없이 마음에 묻을 뿐이다. 『아버지, 돌아오다』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아버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낸 것이다. 남겨진 이들, 장례를 끝내고 다시 생활로 돌아온다.
======================================
(격주간 <기획회의>. 한국출판마케팅 연구소 발간. 여기에 쓰는 글에서는 ‘책’이라는 개념으로 최대한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야 어찌되었든. 즉, 업계인 뽐뿌질 용.)
– Copyleft 2006 by capcold. 이동자유/동의없는개작불허/영리불허 —
!@#… 글을 쓰던 때가 작년 말, 한 유망한 예비작가가 안타깝게 명을 달리한지 얼마 안되었던데다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해서 장례와 이별에 대한 이야기로 했건만, 생각해보니 신년 첫호에 실리는 원고였다. 이런 타이밍 미스라니…;;;
 |
아버지 돌아오다 최덕규 지음/길찾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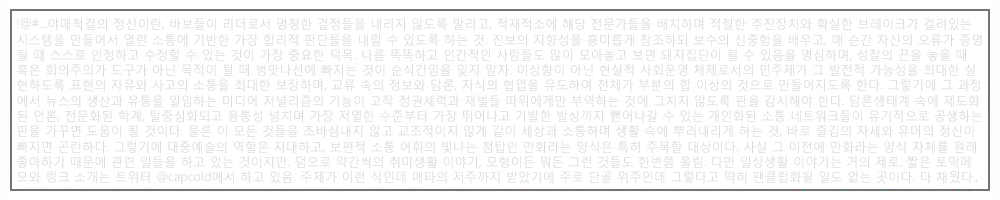
위로: 그 시점에 대해서 아는 캡콜선생님의 지인분들은 이해 차원을 떠나서 오히려 약간의 간접적인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잘모르면서 감히 저도 위로 리플을 달아봅니다. 오늘 잠깐 그 블로그를 들러보았는데 제가 허투루 봐서 그런지 전에 보지 못했던 내용들과 역시 뛰어난 작품들을 몇개 보았죠. 네트웍속에서도 영혼은 죽지 않고 대화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