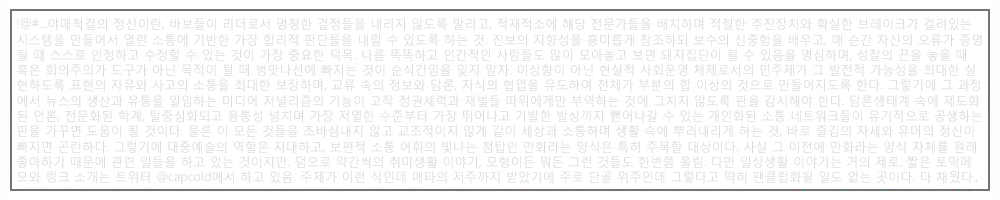!@#… 모든 전문 분야에서 이런 작품이 하나씩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전문분야 에세이만화 – [해부하다 생긴 일]
김낙호(만화연구가)
전문분야에 관한 만화를 만들기 위해, 만화가가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나을까, 전문가가 어떻게든 만화를 다뤄보는 것이 나을까. 당연하게도 각 사례마다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고, 아주 드물게는 양쪽 다 능숙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보다 흔한 경우라면 만화가가 전문적 지식 가운데 스스로 이해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 단순화시켜서 다루는 것이다(혹은 그 이상을 노리다가 작품이 중구난방으로 무너지거나). 그만큼 우리가 무언가를 만화로 읽고자 할 때는 만화로서 일정한 완성도에 이른 그림과 연출을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만화라는 매체양식은 워낙 여러 가지 요소들의 상호보완이 넘쳐서, 좀 성긴 그림과 밋밋한 전개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의 흥미로움 및 이야기를 전달하는 정서의 어떤 친근한 경쾌함과 결합하면 충분히 재밌어질 수 있다. 전문분야의 지식, 그리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활이나 사고방식이 잘 결합되고, 장난스러운 그림 인상과 건조한 상황이 슬쩍 엇박자로 리듬감을 만든다면 말이다. 그런 호흡을 길게 끌어나가는 것이 어렵다면, 짧은 만화를 펼쳐내고 글로 그 상황을 한 토막 보충하고, 다시 짧은 만화로 이어가는 교차 구조도 좋다.
[해부하다 생긴 일 – 만화 그리는 해부학 교수의 별나고 재미있는 해부학 이야기] (정민석 / 김영사)는 바로 그렇게 이뤄져 있는 작품이다. 해부학 전문가인 정민석 교수가 스스로를 해랑(해부사랑의 약어) 선생이라는 캐릭터로 등장시켜 그려내는 만화로, 해부학과 연관된 여러 의학적 지식 및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생생한 생활담을 위트 넘치게 펼쳐낸다. 자신의 캐릭터가 고정적으로 등장하지만 극적으로 포장한 꽁트가 아니고, 차가운 관찰에만 집중하는 다큐멘터리도 아니다. 그저 토픽에 따라서 의료계 사람들의 판단 방식에 대한 설명, 의학적 지식, 그 모든 것에 대한 단상 등이 자유롭게 오가는 에세이에 가깝다.
원래 처음 이 만화는 웹페이지에서 “학생들에게 해부학을 쉽게 전달하고 싶고, 사람은 웃으면 오래 기억하는데 만화는 웃음을 줄 수 있어서”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전문적인 분야를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풀어 전달하는 것에 해당 전문가가 직접 나서는 것이 해야할 일들 중 하나라는 이야기도 했다. 이렇듯 [해부하다 생긴 일]은 담긴 지식의 전문성이 알차고, 웃음으로 쉽게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나 일반인에게 그 분야의 성과와 내막을 알려준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다. 그 바탕 위에서, 그림 솜씨를 연마하거나 절묘한 연출법을 깨우치는 쪽으로 집중하기보다, 지식을 더 잘 풀어내는 것 하나에만 초점을 맞춘 듯한 깔끔한 설명솜씨와 토픽 선별을 보여준다.
44개나 되는 각 꼭지는, 만화가 나오고 그 만화의 내용을 그대로 다루며 글로 보론한다. 예전 [딜버트의 법칙]이 그랬듯 만화와 글의 내용이 서로를 보충한다기보다는, 만화가 어떤 내용을 재미있게 소개해주면 글이 약간 긴 주석처럼 더 자세히 설명해놓는 방식이다. 토픽들은 인간의 몸을 보는 의료인의 시각부터, 각 기능의 의미와 의료 종사자들의 의학적 일상, 그리고 아예 직접적인 의학 지식까지 고르게 섞여있다. 특히 핵심적으로 다루는 해부학의 현장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존재와 몸이라는 형상에 대해 무겁지 않지만 경건하게, 어렵지 않지만 신중하게, 경박하지 않지만 유쾌하게 풀어낸다. 이런 사고방식은 첫 에피소드에 이미 대단히 효과적으로 압축되어 있다.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환자를 따뜻하게 볼 필요도 있지만, 차갑게 볼 필요도 있다. 의사가 환자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눈으로 차갑게 볼 필요도 있다는 뜻이다. 보기를 들어 의사는 ‘환자가 얼마나 아플까?’보다 ‘환자가 어째서 아플까?’를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넋이 없는 시신을 차갑게 보는 것은 의사가 되는 과정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인간의 존재를 따뜻하게 보는 것과 인간의 몸을 냉철하게 보는 것은 결코 별개가 아니다. 학생들을 엄격하게 가르치는 것과 그런 수련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인간미를 발견하는 것도 별개가 아니다. 의학을 위해 자신의 몸을 기증한 사람들의 주검을 매일 마주보며, 인간의 유한성과 숭고함을 동시에 늘 지각하게 된다. 그렇기에 어떤 기회도 손쉽게 낭비할 수 없이, 몸이라는 것에 대하여 배우고 깨우쳐야 한다. 힘들여서 좋은 일을 하는 자기 업종에 대한 섣부른 자랑이 아니라, 그저 그런 식으로 몸에 대한 이해가 이뤄지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이니 좀 더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도 있다는 듯한 정서를 표현해낸다.
인간미 있는 위트를 표현해내는 주요 기법 중 하나는, 바로 해부학 농담이다. 많은 꼭지들이 해부학 농담을 소개하고 그 농담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함께 전면으로 끌어낸다. 농담이 왜 웃긴지 설명하는 난감한 접근이 아니라, 그쪽 전문분야에서 종사하다보면 다른 일반인들과 어떻게 다른 시야를 가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며 독자들이 그쪽 시야의 방향으로 살짝 생각의 지평을 넓혀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농담을 중시하는 이런 자세 덕분에 공책 낙서를 연상시키는 그림체는 명랑만화의 정서를 연상시키고, 살짝 어색해보일 수도 있는 사람들 사이의 상황은 그 자체로 유머가 된다. 한 토막을 인용하자면 이런 식이다.
“의과대학 학생이 해부학 공부에 시달리다 보면, 잘 때 해부학 꿈을 꾼다. 세 학생이 모여서 자기의 끔찍한 꿈을 이야기한다. “나는 시신 옆에 누워 있는 꿈을 꾸었다.” “나는 아예 시신이 되어서 해부되는 꿈을 꾸었다.” “나는 낙제해서 다시 해부하는 꿈을 꾸었다.” 보통 사람한테는 둘째 꿈이 가장 끔찍하겠지만, 의과대학 학생한테는 마지막 꿈이 가장 끔찍하다.”
[해부하다 생긴 일]은 일반인의 생활 건강에 필요한 수준을 넘는 전문적 소재들이 많아서, 의학 ‘상식’만 원하는 이들에게 최상의 재료는 아닐 수 있다. 의대생활에 대한 흥미를 충족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의대를 무대로 한 드라마틱한 작품들이 나을 수 있다. 하지만 몸이라는 것의 복합성, 그 복합성을 캐나가는 과정의 멋짐, 그 길을 추구하면서 생겨나는 인간미 등을 겹겹이 즐기고 싶을 때, 이만한 재미를 줄 수 있는 것은 또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
해부하다 생긴 일 정민석 지음/김영사 |
======================
(격주간 <기획회의>. 한국출판마케팅 연구소 발간. 여기에 쓰는 글에서는 ‘책’이라는 개념으로 최대한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야 어찌되었든. 즉, 업계인 뽐뿌질 용.)
다음 회 예고: Ho!
_Copyleft 2015 by capcold. 이동자유/수정자유/영리불가_
[이 공간은 매우 마이너한 관계로, 여러분이 추천을 뿌리지 않으시면 딱 여러분만 읽고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