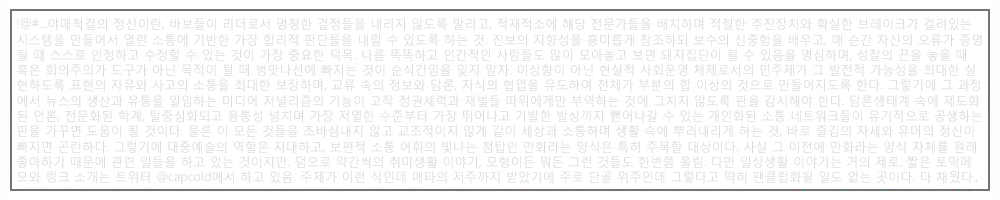90년대 중반, ‘라구요’라는 대중가요가 잔잔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다. 한번쯤 북녘땅을 밟아보고 싶다고 한숨 쉬시는 아버지 – 여기까지는 단순한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이 노래가 특별했던 것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두만강 푸른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본 적은 없지만, 아버지 덕분에 그 노래만은 잘 아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무슨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란 말인가.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한 감정은 상당히 애매할 수 밖에 없다. (일상생활 속으로 완전히 뿌리내린) 뭔지 모를 소위 민족적인 사명이라는 것과, 현실적으로 전혀 다른 낯선 나라라는 두 가치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후세대의 모습이다.
오영진의 <남쪽손님>은 북한 생활상에 대한 관찰로 이루어진 만화지만, 사실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 자신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 작가가 경수로 건설하러 출장갔던 북한. 작가의 자화상인 오대리에게 북한은 무슨 염원의 땅이 아니다. 그 곳에는 모든 것을 뛰어넘은 뜨거운 동포애가 넘쳐나기보다는, 엄격한 제한사항들에 대한 조심성과 서로에 대한 차이 확인이 자리잡고 있다. 마치 7-80년대의 중동처럼, 이곳 역시 단순한 출장지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3국인이 아닌 ‘남쪽 손님’에게 북한이 가지는 의미는 결코 평범할 수 없다. 북쪽과 남쪽의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커다란 기념비부터 세워놓기 좋아하는 습성부터 시멘트 빼돌리기, 막무가내로 자존심 건드린다고 고집부리는 아저씨까지. 심지어 ‘수령님 살아계실 때가 좋았지’라는 북한 주민의 대사와, 당장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박통 때가 좋았지’라는 푸념의 그 섬뜩한 유사성이란! 특히 만화라는 장르의 장점을 듬뿍 살린 낙서체의 열린 선들과 짧은 호흡의 일화들이, 마치 틈틈이 적어놓은 메모장 같은 느낌으로 더욱 그곳에서 겪은 일들의 역설과 희극성을 돋보이게 해준다. 강박적인 민족주의라든지 제대로 소화해내지도 못하는 정치논리 또는 맹목적인 통일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신이 보고 겪은 만큼의 북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이다. 사이사이에 교차하며 등장하는, 전문필자가 집필한 북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설명문 역시 이 책을 더욱 맛깔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다.
오랜 시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동질감이니 형재애니 하는 것은 곤란하다.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를 가감없이 서로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 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돼지 김일성이 지배하는 악의 제국이 등장하는 70년대 <똘이장군>의 시대는 지나간지 오래지만, 그 빈 자리에는 아직 새로 들어선 것이 많지 않다. <남쪽손님>의 오대리처럼 우리들도, 그 곳에 이쪽과 비슷비슷하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배워나가는 세상 – 이천년대 한국의 일상적인 풍경이다.
[으뜸과 버금 2004. 6.]
(* 주: 원출처는 YMCA에서 운영하는 ‘으뜸과 버금’의 월간 소식지입니다. 좋은 만화를 소개받고자 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지면의 성격상… 분량도 capcold답지않게 짧고, 주례사 느낌이 강합니다;; 닭살이 돋더라도 참으시기를)
— Copyleft 2004 by capcold. 이동자유/수정자유/영리불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