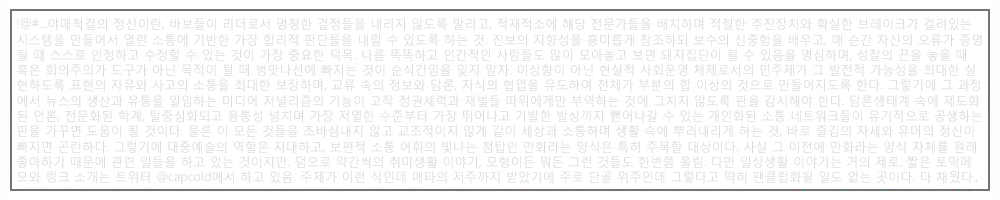!@#… 요는, 다양한 경로가 주어져야 그 사이에서 독특한 성취도 나온다는 것. 게재본은 여기로: [나쁜 친구], 다양한 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발견.
[나쁜 친구]의 앙굴렘 수상에 숟가락 올리기
김낙호(만화연구가)
서비스 규모, 판매량 같은 숫자로 성공을 자랑하면 대충 납득을 받을 수 있는 한국 만화의 산업적 성과와 달리, 비평적 성취를 보여주는 것은 좀 더 어렵다. 그런데 무관심이 뒤집히는 확실한 기회가 한 가지 있으니, 바로 해외에서 큰 상을 타오는 것이다. 그렇게 [나쁜 친구](앙꼬 / 창비)는 수년 전 한 줌 만화 평론가들의 호평 대상에서, 앙굴렘 국제만화축제의 “새로운 발견상”에 빛나는 업적으로 언론 일반에 재발견되었다.
[나쁜 친구]는 “순탄”하지 않은 가정과 학창생활을 하는 두 열여섯 여성 주인공들의 삶과 정서의 단면을 그려내는 작품이다. 작가의 자전적 경험이 녹아들며 거르지 않은 현실감으로 완성된 진주와 정애는, 폭력적 가정환경에 시달리면서 자신들 또한 주변 학생들을 괴롭힌다. 수업을 거르며, 가출해서 여관을 전전하기도 하고, 결국 나이를 속이고 룸살롱에 기웃거리게 된다. 그런 시기를 거치고 한참 시간이 흘러,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의 순탄한 일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약간만 어설프게 다뤄도 흔한 불량청소년 방황 드라마의 클리셰, 즉 멋지고자 하는 위악과 후회의 폭풍 같은 것에 쉽게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나쁜” 생활은 정교한 묘사를 통해 현실적으로 비루하게 다가오고, 절제된 해석을 통해서 감정의 폭발이 아닌 관찰자적 호기심을 선택한다.
작품의 화자로서 진주는 자신의 사연에 몰입해서 고뇌하기보다, 오히려 정애의 갑갑한 현실에 더 집중한다. 진주 자신이 아빠에게 두들겨 맞는 것은 하나의 생활 패턴에 가깝지만, 정애의 가정 파탄은 훨씬 깊숙한 역동을 지니고 도저히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무게감으로 펼쳐진다. 그런데 동시에, 화자는 상대적으로 덜 묶여있는 자신의 살짝 애매한 처지 또한 자각한다. 룸살롱의 문제 현장에서도 진주는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여 도망칠 수 있었지만, 같이 들어간 정애는 그럴 수 없음을 그려낸다. 비슷한 처지라고 여기며 서로에게 보낸 우정은 진짜고, 그 덕분에 서로에게 기대고 탈선으로 우회하며 그 시절을 통과해올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의 압박 앞에서 둘의 차이는 결국 다른 길을 만들었고, 어른이 된 진주의 마지막 행동은 미안함인지 후회인지 그저 어떤 것도 소화해내지 못한 막연함인지 모를 반응이 되었다. 폭력적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감, 그 위에 펼쳐 놓은 섬세하고 복합적인 감정 흐름은 결국 다른 문화권에서도 온전히 평가받을 만큼 뛰어났던 것이다.
새삼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보다 고작 십여 년 전에 같은 작가가 [앙꼬의 그림일기]를 연재했다는 사실이다. 자전적 요소의 활용, 호기심을 지닌 관찰자라는 모티브가 겹치지만, [그림일기]는 당시 딴지일보가 내세우던 거친 유머 코드와 당대 유행하기 시작했던 일상툰의 범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소소한 것을 관찰해내고 감정적 과잉 없이 직설적으로 낙천적 정서로 승화하는 솜씨가 뛰어나고, 지저분한 낙서체 선으로 귀여운 형상을 만드는 그림체 역시 당시에도 주목을 받았던 바 있다. 그런데 새만화책의 출판물을 중심으로 한 단편 작업들에서, 서구권 인디만화에서 유행한 절제된 정서표현과 건조한 연출양식을 흡수한 듯한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고, 이것은 단편집 [열아홉]으로 출간되었다. 여기에서는 그저 그런 소시민들과 소외받은 이들의 생활이 소재였는데, 일상의 비루한 구석까지 그대로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갈수록 큰 유머나 감동을 요구받는 장르보다는 덤덤하되 묵직하게 파고드는 접근에 더욱 좋은 상성을 발휘했다. 그리고 단편집에 실렸던 거친 여고생의 이야기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확장되어 결국 [나쁜 친구]로 돌아왔다.
[나쁜 친구]의 성취는, 오늘날 누구나 흥분하는 특정한 인기 장르나 제작 경로 하나가 한국만화 전체를 떠받드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웹툰 유행이 열어준 새로운 작가 데뷔 경로, 90년대부터 가늘지만 길게 기반을 다져온 인디만화 출판의 작가주의적 흐름, 잔뼈 굵은 문학전문 출판사의 만화분야 진출 및 정착 등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한 속에서 작가의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앙굴렘에서 인정받은 것 역시, 애초에 한국만화가 인기 장르오락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젊은 작가주의적 시도가 꾸준히 소개되고 있었기에 좀 더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었다. 십수년전 앙굴렘 한국만화특별전을 통해 유럽권에 한국만화를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했을 때의 전략적 주안점이기도 했는데, 이후 카스테르망 같은 유수 출판사를 통해서 최규석, 변병준, 박기웅 등의 작품이 지속적으로 출간되며 비평적 관심을 이어갔다. 그리고 한국만화가 대중적 히트작들, 특히 인기 웹툰을 통해 주류적 입지도 충분히 더 확보하면서 그 관심은 다시금 다른 영역의 만화로도 확산되었다.
결국 강한 한 가지에 대한 열광과 집중 이상으로, 건강한 다양성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는 평범한 교훈인 셈이다. 이것이 비단 만화 분야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_Copyleft 2017 by capcold. 이동자유/수정자유/영리불허_
[이 공간은 매우 마이너한 관계로, 여러분이 추천을 뿌리지 않으시면 딱 여러분만 읽고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