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TCHMEN 영화판. 그럭저럭 재미있게 잘 봤다. 만약 아주 팬이라면 장면들이 재현되어 움직인다는 사실에 이미 감격할 것이고, 원작을 아예 모른다면 당혹스러울 것이다.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 한국의 원작 팬들. 영미권의 원작 팬들 원작을 꽤 오래전에 문화충격으로 받아들이고 마음 속에 하나의 고전으로 위치시켰기에 ‘돌아온’ 숭배의 대상에게 열광할 준비가 되어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책이 나온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기에 그냥 이 명작의 영화화겠거니 정도지 어떤 스스로 열광할 만한 심리적 기대가치가 없다. 작품 자체로서 말고는 즐길 부분이 없다는 것. 뭐… 아까운 일이다. 그건 뭐랄까, 닥터맨하탄이 코끼리를 노출시키며 돌아다니는 것에 환호를 하느냐(그래, 원작을 재현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감상을 방해받느냐의 차이랄까. 혹은 로어셰크의 움직이는 가면에서 변화하는 표정을 읽어내느냐, 아니면 움직이는 것에 그냥 신기해하느냐의 차이. 뭐 그런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차이다.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더 즐길 수 있는 거니까.
!@#… 개인적으로는, 닥치고 로어셰크. 정말 우직하게 나쁜 놈이다. 코미디언도 얼추 99점. 살아있는 아메리칸 조크 그 자체다. 나이트아울도 합격점이긴 하지만, 좀 더 우울하고 찌질했으면 좋았을 것을. 닥터맨하탄은 변경된 시나리오의 최대 희생자. 오지맨디아스는 좀 더 선한 표정의 배우였으면 좋았겠고, 과거가 너무 안 다루어지는 바람에 바보된 케이스. 실크스펙터는 배우가 좀 발연기(베드신에만 혼을 불태우고).
!@#… [스포일러] 하지만 역시, 단점은 한 다스. 결정적으로 오징어가 안나왔다. 공동의 적 앞에서 인류는 하나라는 발상만 살리면 된다는 식은 곤란하다. 작품 속에서 사회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막연한 공포와 광기의 극단을 결국 펑 터트려주는 역할인데, 영화 속의 바뀐 엔딩으로는 광기가 없다 광기가. 덤으로 퍼랭이가 너무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됨으로써 원래 역할인 초월적 관찰자라는 포지션이 흔들린다. [/스포일러]
!@#… 영화판은 뭐랄까, 시각적 재현에 대한 세밀한 집착은 있지만 작품의 정서를 옮겨넣는 섬세함이 없다. 원작은 너무나 현실적인 듯하면서도 어처구니없는 광기로 점프하고 또 돌아오는 널뛰기 속에서 현실풍자와 장르해체, 진지한 스릴러와 ‘캠피’한 블랙코미디를 오갔다. 그런데 영화판은 그냥 진지하기만 하다. 오로지 예외가 바로 미국 현대사의 대체역사를 훑어주는 오프닝시퀀스인데, 원작에서 언급 혹은 암시된 순간들에 대한 감독 자신의 상상에 의거한 시각화와 함께 현실성 넘치는 블랙코미디 감각이 출중하다. 만약 영화 전반이 이런 기조를 유지했다면, 작품의 품격은 두 단계쯤 올라갔을 것이다(오징어가 빠졌을 리도 없었다). 하지만 원작을 자신만의 것으로 재창조하고자 하는 야심은 오프닝 시퀀스가 끝나면서 같이 끝난다. 이후는 그저 장면 재현의 팬필름질에 몰두.
!@#… [스포일러] 섬세함 부족은 뭐든 직접 친절하게 보여주려는 과잉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영화 성격상, 폭력이나 잔인함이 특별히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로어셰크의 과거, 여아 유괴사건을 보자. 여자애 신발 신은 다리를 개들이 물어뜯고 있는 장면 말이다. 원작에서는 만화 특유의 칸편집의 묘미를 극대화시킨 대목인데, 로어셰크의 가면 무늬를 보여주고, 도마, 여자애옷, 개들이 물고 있는 무언지 모를 큰 뼈, 그리고 변한 로어셰크의 가면 무늬 클로즈업 등이 소리 효과 하나 없이 차분하면서도 강렬하게 흘러간다.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순진한 가면쓴 자경단원 월터가 폭력 히어로 로어셰크로 바뀌는 광기의 폭발 순간이다. 그리고 이건 매체 차이라기보다, 연출 실력의 차이다. [/스포일러]
!@#… 작품 속 진행되는 사건, 캐릭터들의 사연을 줄거리로서만 파악하고 그것에 애정을 지니며 최대한 집어넣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듯 하기도 하다. 앨런 무어나 닐 게이먼 같은 영국 작가들이 작품 속에 층층이 쑤셔넣는 사회현실에 대한 풍자와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 같은 것은 그러나 줄거리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놓치기 쉽다. 아무리 영국과 미국이 종종 같은 만화권역으로 묶인다고 해도, 미국 히어로만화와는 접근법이 종종 다르다고. 공포와 광기로 묶여있고 또 유지되는 사회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통찰은 유감스럽게도 영화판에서는 미소냉전이라는 과거, 그것도 대체역사로 만들어진 인공적 기억 속의 맥락으로 형편없이 축소되었다. 아무래도 역시 아쉬운 일이다.
!@#… 뭐 그래도 재미있게 봤다. 장면들이 살아 움직이니 좋고, 이런 것이 영화화되어 블록버스터로 걸렸다는 것 자체가 주는 쾌감도 상당하다. 하지만 역시 십수년전 논의되었다는 테리 길리엄판 5시간짜리가 더 보고 싶었다. 반쯤은 브라질, 반쯤은 12몽키즈, 그리고 간간히 몬티파이슨 감수성으로. 아니면 아예 12부작(반드시 12부작) TV시리즈라든지. 에드가 라이트 감독 닐 게이먼 극본이라면 좀 승부해볼만 하겠다.
— Copyleft 2009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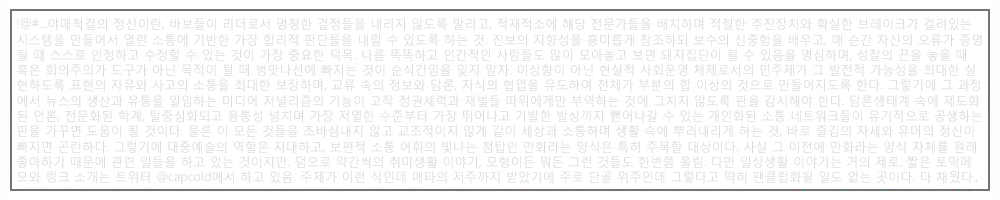
Pingback by 스테판's Movie Story
[리뷰] 왓치맨 (Watchmen, 2009)…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다. ‘코믹북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유명한 슈퍼히어로가 시체로 발견되게 해보자.’ 미스테리가 풀려감으로써, 우리는 이 슈퍼히어로 세계의 진심에 점점 더 깊이 …
Pingback by Dark Side of the Glasmoon
왓치맨; 오지맨디아스와 거대괴물…
어쨌든 영화화, 왓치맨
같은날 개봉한 “더 레슬러”와 “프로스트 vs 닉슨”이 포스팅을 기다리는 마당에
“왓치맨”을 한 번 더 꺼내는 것은 가장 만만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