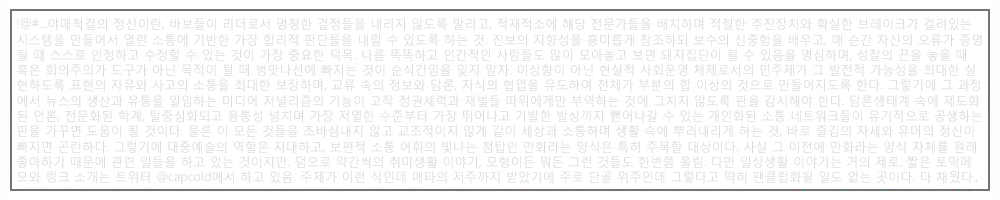!@#…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그 이유로 포털사이트가 어쩌느니 조직문화가 어쩌느니 기자실이 어쩌느니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에 있는 것은 바로 언론사들이 스스로의 품격을 차별화할 필요성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스포츠신문이고 연예타블로이드고 자칭 중앙일간지고 간에 한 면만 잘라놓고 보면 혹은 아예 기사 하나만 잘라놓고 보면 거의 구분이 안간다니까. 구분이 안가면, 마치 중력이 작용하듯 당연히 하향평준화양적팽창이 이뤄질수 밖에. 사람들이 포털에서 뉴스를 보고 어디에 인용을 할 때 ‘**일보 기사’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네이버뉴스에서 봤어요’라고 쓴다는 것이 얼마나 적신호인지 도저히 위기감이 돌지 않는 것일까.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끝까지 읽기(클릭)
Tag Archives: 언론위기
기타 천재 납셨다고 미국언론님이 말씀하셨다 한다
!@#… 몇주 전, 국내 언론에 전 세계가 알아준 한국의 기타천재가 나왔다느니 하는 기사들이 한동안 연예란과 사회란을 꽤 뜨겁게 도배한 적이 있다. 논설위원급의 세설까지도 나올 정도로 불타올랐다가도 (네이버 기준으로 찾아보니 300건이 넘어간다;;;), 당연히 이 판이 보통 그렇듯 약간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사그라들었지만.
여하튼 이미 널리 알려졌다시피, Funtwo라는 아이디로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간 전자 기타 속주 동영상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군지 밝혀졌다는 뉴욕타임즈의 기사 한 편이 그 한바탕 붐의 바탕에 있다. 뉴욕타임즈에 뜨자마자 기사내용은 한국의 수많은 언론들에 의하여 수입. 뭐, 여기서 괜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간단한 생각이야 이런 것일 터이다. 에잇, 이 담론 사대주의자들, 미국이 히트시켜주니까 부화뇌동해서 설레발이구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지는 8개월이나 됐고 또 히트친 현상 자체도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직접 발굴할 능력도 관심도 없다가, 미국 유명지가 프레임을 던져주니까 그대로 받아먹었구나… 뭐 그런 뻔한 이야기들. 담론 종속성에 대한 의구심. 하지만 뭐 그런 건 어제 오늘일도 아니니 언젠가 다른 기회에.
그보다 이번 건에서 재미있는 점은, 뉴욕타임즈 보도가 나가자마자 한국에서는 주인공 임정현씨를 스타만들어주기 프로젝트가 곧바로 발동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당시 나온 대부분의 기사들은 전형적인 연예스포츠 신문 삘의 스타 만들기였는데, 한마디로 “뉴욕타임즈에도 나온 훌륭한 기타 신동이다” 라는 식이었다. 8월 마지막-9얼 첫째주에 나온 기사들이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인용한다고 클리핑한 부분을 보면, 맨 연주 실력 칭찬 부분 뿐이다. 세계가 칭찬하는(즉, 미국님이 칭찬해주시는) 기타천재 나셨네, 하고 빵빠레. 스위핑을 잘한다고 말씀해주셨다, 하지만 우리 겸손한 주인공님은 잔실수 많다고 스스로 인정도 한다 쪽 내용만 깨끗하게 추출했다. 거기에 한국의 프로 기타리스트도 칭찬했다는 나름대로 자체 취재도 살짝 곁들여서. (주: 뭐, 정식 언론학 연구였다면 기사들을 주욱 모으고 내용분석을 해서 통계를 내야했겠지만… 이건 연구 아니라 잡설이니까 그냥 위대한 멘트 하나로 넘어가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리고 그런 언론보도들을 바탕으로 여러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역시 임정현씨의 연주실력이 진짜 그만큼 세계적 수준으로 훌륭하네 아니네 이야기 투성이였다. 한마디로, 출중한 스타냐 아니면 그냥 운좋은 스타냐 하는 것.
아니 그런데… 정작 진짜 뉴욕타임즈의 기사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바로, 유튜브라는 동영상 사이트를 통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패턴 자체. 즉 동영상을 올려서 수백만 조회수의 스타로 등극할 수 있다는 ‘시스템’에 대한 소개고, 그것을 위한 사례로서 이번 건이 등장한 것. 애초에 동영상이 올라간 제목은 달랑 ‘guitar’였고, 무표정하게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던 그 미스테리 주인공이 밝혀졌다는 것. 인터넷 특유의 ‘익명성’, 그리고 ‘무명의 실력자들의 데뷔 무대’ 개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기에 너무나도 좋은 사례란 말이다. 그에 비해서 정작 파헬벨 카논 록버젼이라는 이 곡을 처음 쓰고 연주했던 대만인 기타리스트 제리창은 이미 성립된 스타인데다가, 얼굴도 이름도 이미 처음부터 밝혀져있던 상황이기에 메인으로 올라가지 않았던 것 뿐이다. 특히 후반으로 가면 클래식을 락으로 연주하는 것, 하나의 히트를 서로서로 연주 경연하며 올리는 것 등에 대한 이야기에 할애하는 부분을 보면 이런 전체 주제가 더욱 명확해진다. 즉 스타에 대한 주목을 빌미로, 실제로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다. 기사가 대단히 잘 쓰여진 심층 기사라는 것은 물론 아닌데다가 이 동네 기사치고는 상당히 ‘햝아주는’ 내용 투성이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방향성은 제대로 그 쪽으로 향해 있다는 말이다.
흥미로운 차이다. 원래의 기사는 어찌되었든 사회의 소통 방식의 새로운 진화에 대해서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례를 담아내려 하는 기사다. 그게 유튜브의 히트로 어안이 벙벙해하는 이쪽 동네의 진짜 이슈니까. 그런데 그것이 큰 물을 건너오자, 스타탄생 기사로 변신한다. 왜 그럴까. 인터넷으로 스타될 수 있다는 식의 아이템이 워낙 한국에서는 별로 새로울 것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원래부터 계속 모두들 통찰을 해왔으니까? 에이. 시스템이고 통찰이고 자시고 스타 띄워주는 게 가장 기사쓰기 쉬우니까, 그리고 미국도 인정하는 한국의 별이 납셨네 쪽이 안정적으로 화제 끌기 더 좋으니까 쪽에 500원 건다. 현상 자체에 주목하는 예외적 기사들도 한 두개 있었고, 연예프로들을 도배하던 임정현씨의 스타효과가 사그러들자 약간씩 방향이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리플러(…)들의 주목은 바닥권. 뭐, 쓰는 사람 읽는 사람 수준이 비슷비슷하니까 장사해먹고 사는 것 아니겠나. 게다가 애초 초창기 기사들이 뉴욕타임즈에서 클리핑했다는 부분이 너도나도 같은 것으로 보건데, 왠만해서는 원본 기사도 제대로 안읽고 그냥 서로 베꼈다에 또 500원 건다. 그리고, capcold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로 깐죽대봤자 현장 기자들은 코웃음도 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딴 식의 기사를 써댈 것이라는 데에 또 500원 건다. 그게 잘 팔리는 뉴스 수입상의 자세이며, 안정적으로 화제성을 끌어모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패턴이니까.
하지만 한번쯤 상상을 해보는 것은 괜찮을 듯 싶다. 만약 좀 더 취재력과 진짜 통찰력을 가진, 실력있는 기자의 기사가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사실 뉴욕타임즈에서는 몰랐겠지만, 그 기사가 나오기 좀 더 전에 한국에서는 인터넷 전자 기타 동호회 mule의 여러 회원들이 각자 연주한 파헬벨 캐논 락 동영상을 빠른 편집으로 엮어넣은 동영상이 좀 ‘눈치빠른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다. 무명 전문가, 익명성 같은 패턴에다가 심지어 한국식 인터넷 문화 특유의 교류성까지 잘 나타내주는 매력적인 아이템. 상상속의 그 기자의 그 기사는, 뉴욕타임즈 기사가 나오고 나면 아마 두 동영상들을 가져다가 비교해보며 인터넷 문화의 속성을 생각해보겠지. 짠하고 스타가 되기 위해서 어쩌고 한다기보다, 그냥 즐거워서 하고는 그것을 마음껏 서로 ‘공유’하고 ‘교류’한다는 것. 그 공유와 교류 속에서 발전하고, 그러다 보면 히트쳐서 스타가 되기도 한다는 것. 바로 인터넷의 협업, 새로운 스타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뭐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자. 상상은 상상일뿐, 파고들면 짜증만 증가한다. 언론의 위기? 뉴스 작성 실력의 위기겠지.
— Copyleft 2006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사족) ‘눈치빠른 누리꾼’ 개념은 다른 기회에 한번 다뤄볼 생각. 얼리어답터, 트렌드세터 뭐 그런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다듬어야 하기에 궁리중인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