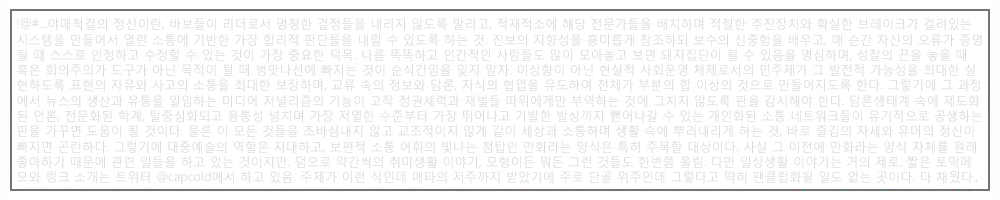!@#… 서울예대 교지 ‘예장’ 29호의 특집 ‘예술에 드리워진 혁명의 그림자’에 한 꼭지로 실린 글. 각 분야의 글들을 모아놓고 보면, 만화/영화/음악을 아우르는 대중예술 쪽 꼭지의 필자들이 보여주는 작품소개 위주의 분류와, 개념용어의 바다에 익사하기 직전인 순수예술 성향의 미술/문학 꼭지의 필자들의 접근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어서 재밌다. (핫핫)
만화가 바라보는 혁명, 혁명이 바라보는 만화
김낙호(만화연구가)
혁명이란, 기존의 근간이 크게 뒤집어져서 그 결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시작되도록 하는 변화를 칭한다. 가장 포괄적으로 내린 이 정도 정의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사실 혁명이란 보기보다 무척 애매한 개념이란 점이다. 얼마나 바뀌어야 개혁이 아니라 ‘혁명’인지 명확한 선을 긋는다는 것은 꽤 임의적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혁명으로 바뀐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지속되어야 성공한 혁명인지 아니면 혁명을 하려고 했다가 단순히 실패한 것인지 역시 역사적 해석이 정해주기 나름이다. 그리고 둘째(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 혁명은 본연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혁명을 겪든 혁명을 이루고자 꿈꾸는 것에 지나지 않든 말이다. 어떤 이들은 혁명에서 불온함과 파괴라는 인상을 받겠지만, 다른 이들은 그 속에서 기존의 갑갑한 무언가를 타파하고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진취적인 변화에 대한 강한 낭만을 느낀다. 그런데 예술 양식이나 기술에서의 혁명이라면 좀 더 세부적인 차원이기에 그 인상 역시 한정적이지만, 아예 사회 체제에 관한 혁명이라면 그 사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피할 길 없는 강렬하고 큰 사건이다. 사회 혁명은 그런 의미로 보자면, 무척 대중과 가깝다.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끝까지 읽기(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