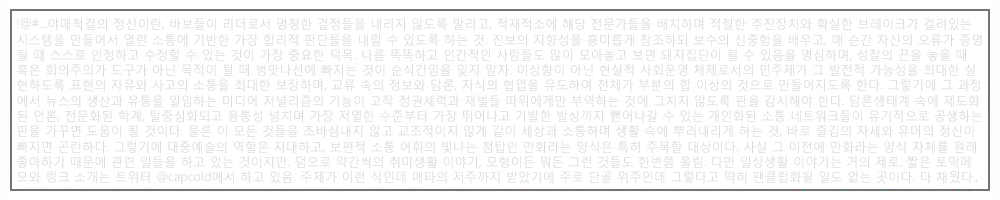!@#… 황교수 논란을 바라보는 외신 보도의 진실. 긴 말 하지 않겠다. 각 기사들의 전문을 옮기면 저작권위반인지라 주요 파트만 인용. 구글에서 제목 입력하면 전문으로 가는 링크가 나오니까 꼭 한번씩 보시길.
사례1]
“황 교수 기술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
[YTN 2005-11-30 07:25]
[신현준 기자]
황우석 교수의 기술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황교수의 윤리적 문제가 장기적으로 세계 줄기세포 연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AP 통신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략)
이 기사에서 원용하고 있는 보도는 이것이다. 제목부터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Stem Cell Setback Won’t Hurt Research
Nov 29, 8:41 PM EST
By EMMA ROSS (AP Medical Writer)
물론, 이 기사에는 황 교수 기술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말 따위는 애초에 없다. 신현준 기자의 소신에 의거한 순수한 창작. 이 보도의 초점은 황교수가 주춤하면 전세계적인 줄기세포 연구의 진전에 장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대한 회답이다. 국제적 공조도 이미 잘 되어있고, 기술은 빨리 전파되기 때문에 이상 없다는 것. 게다가 “줄기세포 연구의 99%는 클로닝과 관련 없다”는 영국학자 Peter Andrews 의 말도 인용. 즉 비교하자면 이런 의미구조다.
원래 AP 기사:
줄기세포 연구 전체 차원, 국제공조, 연구의 진전은 계속됨
YTN 기사에 재현된 AP기사:
황교수의 세포복제 차원, 황교수 대 세계의 경쟁, 기술을 따라잡힐 위험이 있음
흔히 시쳇말로, “왜곡”이라고 부른다. 전문용어로도, “왜곡”이라고 밖에 못부를 듯 하다. 왜곡의 목표는 너무나 뚜렷해서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다. “한국의 영웅 황랩 연구에 딴지걸면 세계 경쟁에서 지는거야”.
사례2]
“황교수 다음 업적 조심스럽게 점검될 것”
[연합뉴스 2005-12-04 23:24]
이래운 특파원
줄기세포 연구결과에 대한 진위 논란으로 다음에 이루어질 황우석 교수팀의 큰 과학적 업적이 극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여 지더라도 한국인들은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략) …이 신문은 특히 “아직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핵심 문제는 난자 제공에 대한 황우석 교수의 거짓말이 과학적 결과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을지 모른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중략)… 또 황 교수가 난자 제공의 구체적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당시엔 불법도 아니었다는 의견도 소개하면서 “일부 미국 과학자들도 난자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략)
이 기사에서 원용하고 있는 보도는 이것이다:
(NYT) Editorial
South Korea’s Cloning Crisis
Published: December 4, 2005
South Korea’s high-flying stem cell researchers – reputedly the best in the world at cloning – have stumbled badly in handling the ethical issues of their controversial craft. Worse yet, the research team’s leader, a national hero in his homeland, lied in an effort to hide his ethical lapses. We can only hope that he has not also lied about the astonishing scientific achievements of his research team. (중략)… But what really torpedoed Dr. Hwang was the cover-up: his repeated lies to the effect that his eggs were donated by unpaid volunteers. These misrepresentations led his most prominent American collaborator to sever ties because his trust had been shaken. (하략)
원문의 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난자매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이야기 투성이다. 제목의 ‘Crisis’ 라는 표현은 바로 거짓말에 따른 신뢰성 상실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기사 말미에 가서야 비로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 The key unresolved issue is whether lying about egg donations suggests that the Korean team may have lied about its scientific results. So far there is no evidence of that. Indeed, American collaborators and observers remain confident that the team’s achievements were real. But science is an enterprise that relies heavily on trust. The Koreans should not be surprised if their next scientific breakthrough is greeted with extreme caution.
즉 마지막의 결론은 과학은 신뢰에 의존하는 분야인데 한번 거짓말이 탄로났으니 이후 연구 성과들이 훨씬 더 조심스럽게 검토된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라는 것이다. 결과물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 이야기는, 증거도 아직 없고 미국측 협력자들도 확신하고 있다는 것 뿐. 이번에도 비교하자면 이런 의미구조다:
원래 NYT 기사:
황랩이 윤리문제에 부딛혔다. 난자기증 거짓말 때문이다. 앞으로 신뢰성 검증이 더 까다로워질 것이다.
YTN 기사에 재현된 AP기사:
황교수 다음 논문이 외국에서 견제 당할 것이다. 결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리도 의심스럽다.
이번에는 원문에 아예 없는 말을 새로 지어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기사의 핵심 이슈를 입맛에 따라서 왜곡했다. 이번에도 목표는 뚜렷하게 보인다: “실험 결과에 대한 의혹을 네놈들이 제기하는 바람에 외국에서 앞으로 잘 안 받아준다더라.”
사례3] 이건 워낙 걸작이라서 전문을 옮기고 싶지만, 저작권법이 있으니 적당히 중략.
로이터 “외국 연구자들 황교수 망하길 원해”
[한국일보 2005-12-05 06:42]
“다른 나라 연구자들은 그(황우석 교수)가 폭삭 망하기를 바라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4일‘한국 과학자 은든 중, 그러나 폭풍은 계속돼’라는 기사에서 미 버클리대 데이비드 위닉코프 조교수를 인용… (중략)… 뉴욕타임스는 이 날 ‘한국의 복제 위기’라는 사설에서… (중략)… “핵심은 황 교수가 과학적 결과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을 지 모른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지 여부”라며 “황 교수의 큰 업적이 조심스럽게 받아들여 지더라도 한국인들은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외신=종합
원용한 기사는 앞서 이야기한 NYT 기사와, 바로 이 기사다:
(Reuters) S.Korea scientist in seclusion; storm continues
Sat Dec 3, 2005 10:04 PM ET
By Jon Herskovitz
이 기사 역시 사례1의 AP 기사와 마찬가지로 윤리문제와 그것이 얼마나 전세계적인 줄기세포 연구 진행과정에 장해를 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기사에 거의 문단마다 bioethical이라는 단어가 도배되어 있다). 문제의 다른 연구자들 어쩌고 부분을 보자.
Another is honesty concerning Hwang’s decision not to give information about the donations in a timely fashion, and there is the problem of a lack of global ethical standards for procuring human eggs for research.
“He (Hwang) really is the face of stem cell research and cloning research right now. He has been lionized in some ways,” Winickoff said by telephone. “Researchers in other countries are all too eager to see him go down in flames.”
위니코프 교수의 이야기를 인용한 취지가 바로 앞 문단에 설명되어 있다. 황교수가 제 시간에 난자 기증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은 것의 부정직성, 그리고 인간 난자를 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전지구적 윤리 기준의 부재. 그리고 황교수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담고 있는 분야의 얼굴마담. 그래서 이런 문제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연구자들이 황교수의 몰락을 바라는 것이라는 취지의 인터뷰다.
그런데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는 이 이야기를 NYT 기사로 마무리하는 합성 신공까지 선보인다. “핵심은 황 교수가 과학적 결과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을 지 모른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지 여부” 라는 놀라운 왜곡번역으로 말이다. The key unresolved issue 는 그냥 핵심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직 해결 안된 주요 이슈라는 말이다. 즉 아직 논쟁중이거나 해결 안된 것들 가운데 주요 안건이라는 뜻.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원문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결과를 의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직함의 대가로 검증이 더 빡쌔질꺼다라는 것 아닌가.
덤으로 진짜 히트는, “국가적 자긍심과 국제적 과학이라는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이라는 구절이다. 원문은 “national pride and global science at stake”, 즉 “국가적 자긍심과 전세계적 과학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과학발전의 문제라는 말이다. 이 구절을 교묘하게 틀어서, 다시 그 유명한 ‘국익’ 이데올로기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박상준 기자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고수, 무의식중에 이렇게 했다면 국익이데올로기라는 거대한 기계의 충실한 부품. 뭐 둘 중 하나다. 여하튼, 의미구조 요약이다:
원래 로이터스 기사:
황교수 은둔이 세계적 줄기세포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원래 이 분야는 윤리문제 때문에 민감한 분야. 한국사회가 황교수 연구를 보는 자세의 국가주의적 측면.
원래 NYT 기사:
황랩이 윤리문제에 부딛혔다. 난자기증 거짓말 때문이다. 앞으로 신뢰성 검증이 더 까다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한국일보에서 재현된 기사들:
로이터: 이때가 기회다, 하고 외국이 황교수를(즉 한국의 업적을) 뭉개버리려고 한다.
NYT: 결과가 거짓일 것 같다는 의혹에 외국인들은 무척 솔깃하다.
즉 한마디로 “외국은 이번 기회 삼아 황교수를 깔아뭉개고 기술을 빼앗아가고 싶어한다”고 자연스럽게 묘사해버리는 신공을 발휘하는 것이다. 굉장하다.
!@#… 이상 3가지 사례 모두 국내에서 이들 소위 ‘언론’이 하고 싶은 프레임 설정에 맞도록 외신을 난도질 도입했다. 원래 외신의 틀은 어디까지나 윤리문제다. 거짓말을 해서 과학자로서의 신뢰를 위축시켰다는 것, 그리고 줄기세포 연구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인간생명 윤리문제. 그리고 그 윤리문제가 줄기세포 연구 발전이라는 과제 자체에 어떤 장해를 줄 것인가, 라는 문제.
그런데 YTN, 한국일보, 연합뉴스 등이 설정한 현실 인식의 틀의 핵심은 이것이다:
“황교수에게 딴지 걸면 외국놈들이 기를 쓰고 기술을 빼앗아 간다. 그런데 난자기증 윤리문제고 데이터 진위고 자꾸 딴지를 거니까 외국놈들이 신나서 기뻐한다.”
그것을 위해 외신의 내용을 근거로서 제시한다. 물론 왜곡해서.
!@#… 한국 언론판의 찌라시성이 지금 극단을 달리고 있다. 그것도 ‘여론’까지 등에 업고. 양쪽이 합심해서 전근대적 국익만능주의를 향해서 무한한 폭주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사례 3개만 가지고 간이 해석만 살짝 건드렸지만, 언제 한번 이번 이슈의 언론 보도 전체를 묶어놓고 정식으로 총체적 프레임 분석을 한번 해볼 일이다.
— 2005 copyleft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