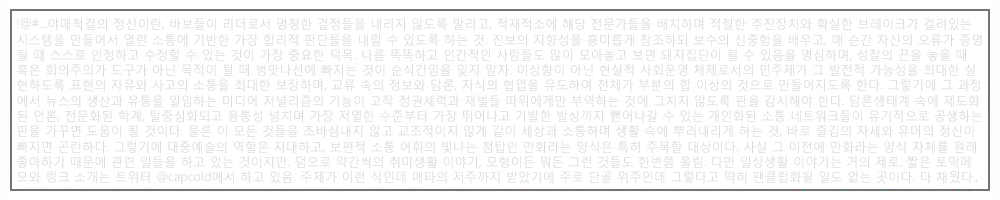!@#… 만만치 않게 굵직한 특집들을 수월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참 신기한 출판저널 ‘기획회의’의 지난 호 특집, ‘인디라이터로 살아가기’ 가운데 한 꼭지. 이런 이야기는 푸념도 뽐뿌도 아니게 균형맞추기가 은근히 힘들지만, 역시 풀어내기가 무척 재미있다.
자유의 성취감과 대가 : 프리라이터로 살기
김낙호(만화분야 프리라이터)
자고로 무엇이든 간에, 이름을 멋지게 붙이면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별다른 조직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전문성 하나를 무기삼아 이런 저런 지면에 글을 써서 먹고사는 글쟁이들에게, 언젠가부터 무척 세련된 느낌의 명칭이 붙기 시작했다. 프리라이터, 혹은 인디라이터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한 의미를 지녔으나 전문성의 측면에서 어감이 무척 다른 자유기고가라는 용어를 언젠가부터 밀어냈다. 어차피 (대체로) 소속 없이 글을 쓴다는 것은 대부분의 작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프리라이터들은 글 자체를 예술적 창작에 대한 욕심으로 다루기보다는, 대부분 전문분야에 대한 실용적 기획을 주로 다루며 글 역시 그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결과물로 다룬다. 해당 분야를 소재 삼아 자기표현을 하는 작가와는 달리, 그냥 그 분야의 전문 인력인 셈이다. 그렇기에 창작의 기술보다 더 중요하게 기획 마인드가 필요하며, 기획자, 저널리스트, 창작자의 중간 어딘가에 있다.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끝까지 읽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