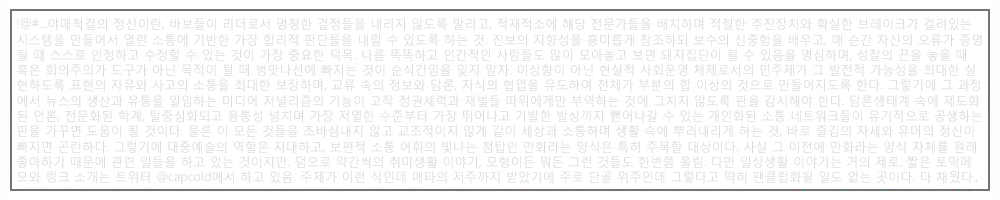!@#… 최근, 모 아나운서의 모 베스트셀러 번역 대필 사건이 잠시 훈훈한 웃음을 선사해주었다. 이 책을 둘러싼 개그는 “하루에 틈틈이 100페이지씩 했어요” 오바질 오보로 시작되어, 그따위 “참으면 부자되고 안 참으면 가난해진단다”라는 초딩스러운 내용의 책이 밀리언셀러가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한층 개그력이 상승했던 터. 그러다가 결국 번역 대필이 뽀록나서 개그의 강렬함이 더해지다가, 출판사가 ‘이중번역’이라는 굉장히 처절한 변명을 하면서 결국 개그 입신의 경지에 도달했다. 세상에, 무려 출판사 사람들이라는 자들이 진지하게 그런 주장을 펼치다니. 다만 정작 그 모 아나운서만 개그에 동참할 정도의 유머감각이 부족한지,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멘트 하나만 날리고, 나머지 실제 잘잘못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아쉬운 일이다.
!@#… 번역작업을 하면서, 여러명의 번역자들로 나누어서 작업하는 것 만큼 뒷수습이 힘든 것이 없다. 어순이나 어미활용 및 용어의 호환성이 높아서 비교적 기계적 번역이 가능한 일한 번역이라면 정도가 확실히 덜하지만, 영한 번역 정도만 되도 정말 골때린다. 특히 팀에 번역 초보자라도 있다면, 그 사람의 원고는 번역 숙련자인 대표 번역자가 실질적으로 깡그리 다시 해야 한다. 전체 책의 문체를 통일하고, 용어의 선택도 맞추고, 전체 문맥을 조율해야 하니까 (capcold의 경우 역시 몸으로 배운 교훈이다). 만약 출판사의 주장처럼 무경험자인데다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초보자 – 예를 들면 모 아나운서 – 와 전문번역가가 ‘이중으로’ 작업을 하고 ‘그 중 잘된것을 짜깁기 했다’면, 99.9% 후자의 번역을 그대로 썼다는 거나 다름없다. 번역이라는 작업 자체가 그런 작업인거다. 그런데 그 아나운서, 책 나온 걸 보고도 자기가 쓴 문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문체와 용어로 되어있는데도 눈치를 못챘나 궁금하다. 보고도 눈치 못챘다면 그만큼 자기도 자기 작업을 기억 못할 정도로 대충 때려넣었다는 것이다. 교열과정에서도, 완성된 책을 받아들고서도 한번도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면 더욱 더 안습이고. 보고 눈치챘지만 생까고 그냥 자기가 한 양 이야기하고 다닌 것이라면 뭐… 진짜 할 말 없어지겠다. 닥치고 이불덮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 여튼 책은 다 팔만큼 팔았으니 뭐 잠깐 버로우하면 출판사도 아나운서도 해피. 다만 짜증나 쓰러질 입장에 처한 것은 대필을 제공한 그 전문 번역가. 대필 번역을 했다면 당연히 인세지분이나 인센티브 없이 매절을 했을테니까 말이다. 그런 경우 (아니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계약서도 따로 정식으로 안하고 작업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책은 잘팔리고, 번역에 대한 공은 엉뚱한 사람이 들고 가니 뭐 클레임 걸고 싶지 않겠는가. 책 좀 잘 팔릴때 출판사가 알아서 잘 기름칠을 했어야 했을 부분인데, 뭐 돈에 눈돌아가면 자기 두개골 내부말고 뭐가 또 보이겠나. 그리고 언론에서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서야 출판계의 어려운 현실이니 아나운서에게 죄송하다느니 설레발이다. 그리고 아나운서한텐 송구스러운데 정작 번역자에게는 하나도 안 미안해하니 그것도 참 안습이다.
!@#… 번역분야가 출판계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거야 뭐 뻔한 이야기니 반복할 필요도 없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번역이라는 작업 자체가 학계든 출판계든 지극히 우습게 취급되고 폄하된다는 점이다. 특히 학계에서는 번역서에 대한 변변한 경력 인정이 안되기 일쑤인데, 그래서 유명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한 챕터씩 나눠주고는 적당히 수거해서 역자 후기만 쓰고 출판사에 넘겨준다는 괴담이 도는 것. 하기야 진정한 괴담은, 그 결과 번역서랍시고 나와있는 이론서들이 거의 한국말이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로 전혀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전달력도 없는 전문용어들의 기계적 짜집기 덩어리로 나와서 원서에 대한 독서욕구를 불태우는 실제 현상들이다. 기실 번역이야말로 원 자료는 물론 원 저자의 학문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또하나의 창조, 재해석을 해서 한국의 맥락에 맞게 설명해내는 복잡한 작업이며 훌륭한 학문적 성과가 되어야 할 터인데 말이다. 마틴 루터의 진짜 중요한 일생의 과업이자 종교개혁의 뿌리는 열받아서 대자보 붙이고 다닌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 아니던가. 나름대로 룰이 있다는 학계가 그럴 정도면, 일반 출판계야 뭐 할말 다했다. 번역 품질보다는 가격에 맞추는 패턴만 벗어나도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 그러니까 이제부터 번역을 좀 잘 취급해달라고? 내가 여기서 그런 말 한마디 한다고 개선될 성격의 것이라면 이미 이 곳을 다 도배해놨을 것이다. 번역이 우습게 취급되는 것은 실제로 독자들이 ‘독서행위의 품질’에 신경을 안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다. 대체로 까다롭지 않고, 대충 밀가루 위에 캐첩만 뿌리고 본토 이태리 피자에요 내놓으면 아싸조쿠나하면서 받아먹으니까. 좋은 번역에 대한 독자들의 수요가 적은데 뭐하러 출판사가 애써 신경과 돈을 써가면서 공급을 하겠는가. 번역자가 그 책을 한국어로 들여오기 위해 직접 출판사에 소개시켜주고 자신의 성심성의를 다해서 전문적으로 작업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모를까, 출판사가 책을 찍고 번역자를 구하는 보통의 경우라면 어디까지나 품질보다는 기대 충족의 효율성을 따질 수 밖에. 학계도 마찬가지여서, 저널의 도서리뷰에 “이 책은 번역이 개판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경우가 없다. 학생들은 그냥 원래 어려우니까 어려운건가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기 십상이고. 번역의 품질을 따지며 더 나은 번역문화를 요구하는 자리 자체가 없는 것이다. 워낙 광팬을 거느리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 정도가 몇 안되는 예외지만, 광팬이 많아도 여전히 해리포터 시리즈의 허마이오니는 한국에서 헤르미온느일 뿐.
!@#… 좀 갑갑한 이야기지만, 결국 상황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란… 따지는 것. 번역이 개판이면 번역자가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따지고 몰아붙여서 좋은 번역에 대한 압박을 주는 것. 수요가 요구하면 공급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고품질 공급이 필요한 판이 되면 야매스러운 관행들이 하나씩 사라질 수 있다. 사실 이야기가 번역계의 사기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 번역의 품질 이야기로 귀결되고 있는 셈이라 읽다가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하나의 ‘판’을 제대로 정돈하고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그 분야의 총체적 품질을 올리는 것이다. 향유 사슬의 가장 끝에서부터,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바로 시장체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품질 향상의 지름길이니까. 뭐 여하튼, 그러니까 우선 독서를 좀 더 까다롭게 하는 습관부터.
— Copyleft 2006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